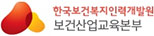쿠바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 작성일 | 2018-11-12 | 조회수 | 1,786 |
|---|
쿠바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중남미대륙을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미 그 대륙은 아주 오래 전부터 원주민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들은 나름대로의 큰 문명을 이루었다. 우리가 흔히 아스텍, 마야, 잉카문명이라 부르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침략자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신대륙의 발견’이지만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본다면 명백한 ‘두 세계의 만남’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구대륙(구세계)’와 ‘신대륙(신세계)’의 만남인 것이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후 스페인에서는 남부지역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이주민 역사가 시작되엇다. 이들은 남성이 먼저 이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현지 원주민들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기도 했다. 그 결과 메스티소라고 불리는 혼혈인이 중남미에 다수 출현하게 되었다. 초기 이민의 목표는 대부분 원주민을 통한 대규모 농산물의 생산이었다. 큰 농장을 만들고 원주민을 잡아다가 강제로 노동을 시켜서 큰 이윤을 만들고자 했던 초기 이민자들의 꿈은 질병에 걸린 원주민들의 갑작스런 사망과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것은 노예상인의 등장이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은 잡아다가 어두컴컴한 배의 밑바닥부터 켜켜이 쌓아서 수십 일을 이동하여 중남미에 노동력을 공급한 이들은 중남미의 농장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다. 수십만의 아프리카 흑인들이 좁은 배 안에서 질식사했지만 살아남은 노예를 통해 농장은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흑인과 백인의 혼혈인, 그리고 흑인과 중남미 원주민의 혼혈인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서론이 길었다. 중남미는 스페인계 백인 분만 아니라 황인종으로 분류되는 중남미 원주민,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이 공존하는 인종의 도가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혼혈인들이 대를 이어 살아온 하이브리드(혼종) 사회 집단이다. 이와 같은 특색이 가장 잘 살아있는 곳이 감히 쿠바라고 말하고 싶다.
중남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백인은 여전히 부를 세습하며 사회의 주류로 살아온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와 같은 인종적 차별이 철저히 배제되었고 필자의 개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인종적 평등이 잘 구현된 국가 중 하나이다.
쿠바의 또 다른 특징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이다. 최근 개방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주택의 사유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외국자본의 도입을 장려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주의 구호가 지역 곳곳에 남아있다. ‘사회주의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구호가 시골 마을 곳곳에 있는 큰 벽에 쓰여 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높은 의료수준이다. 여기서 ‘높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정의해야 한다. 중남미 지역 전체를 놓고 볼 때 높다는 뜻이며 좌파 정권의 국가들을 놓고 볼 때 더욱 그렇다는 뜻이다. 쿠바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전 대통령이 말년에 암으로 투병할 때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을 만큼 전통적인 의료 강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인근 멕시코과 비교해본다면 영역에 따라 강점이 다소 보일 뿐이다. 예를 들면 사탕수수에서 뽑아낸 폴리코사놀의 무상공급은 전 국민의 평균혈압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거의 무상에 가까운 의료 서비스는 의료진의 희생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국민 전체의 권익 증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의료인들의 해외 수출 및 해외 탈출은 쿠바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쿠바는 한류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얼마 전 방문한 호텔의 한 직원은 한국 드라마를 84편 봤다고 필자에게 자랑하기도 했다. 한국에 대한 기본적 선호도가 대단히 높은 쿠바는 이제 먼 곳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까운 관광강국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본 기고문은 필자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언급된 기관, 단체와 공식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전글 몽골 보건 의료 자원 정보
- 다음글 중국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비약적 발전 1